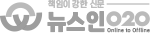(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에 미증유의 홍수 피해를 기록한 을축년 대홍수를 연구한 서울기획연구 12 『을축년 대홍수 그 후 100년, 서울의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을축년 대홍수(乙丑年 大洪水)가 발발한지 10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아 재난·재해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재난 이후’에 초점을 맞춘 연구서이다. 오늘날 재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했다.
연구에는 염복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책임으로 예지숙(숙명여자대학교), 고태우(서울대학교), 이향아(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 1925년 미증유(未曾有)의 대홍수 발생
1925년 7월 9~11일과 15~19일까지 두 차례 집중호우의 양은 753mm에 달했고, 복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연이은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한강의 수위는 (구)용산 기준으로 12.74m로 현재까지의 최고 기록이다.
지금의 이촌2동·뚝섬·잠실·송파·신천·풍납동 일대의 마을이 유실됐으며 용산·마포·영등포의 주택 대부분도 침수 피해를 보았다. 이 외에 안국동·관훈동 등 시내에 자리한 지역도 수해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한강 주변의 침수가 심했는데 한강교가 무너지고, 노량 수원지와 마포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피해로 서울의 상수도와 전기도 중단됐다. 한강의 지류도 변형되어 잠실도 주변의 한강 본류가 섬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뀌었다.
◆ 영향 1) 재해 기부금 모집 제도화의 계기 마련
을축년 대홍수 발생 직후 총독부는 부족한 구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연금(사회적 공익이나 자선을 위하여 내는 돈) 모집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복구대책은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불평등하게 이루어졌고, 조선사회의 신문사, 청년회 등이 주축이 되어 공적 구호가 닿지 않는 곳에서 수재민의 구출, 식량 구호, 의복 구호, 구호소 마련에 나섰다.
총독부는 ‘조선수해이재자구제회’라는 관제단체를 만들어 의연금을 모집했고 조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정금·의연금 모집을 흡수하고자 했다. 일제의 구제 활동은 의식주의 제공 등의 응급 구호, 조세 감면, 물가 통제 등과 같은 제도적 구제 그리고 수산(授産) 구제(일자리 제공) 등이 있었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정부 혹은 권력이 사회조직을 통해 모금 활동을 하고 이를 구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을축년 대홍수를 계기로 마련됐다. 즉 을축년 대홍수의 경험은 이후 한국의 재해 구제에서 중요한 참조항이 됐던 것이다.
◆ 영향 2) 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연대와 공동체 문화
식민지 시기 차별 속에서도 각지의 주민들은 홍수 피해를 벗어나서 상호 연대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복구해 갔다. 이촌동에서 이주한 주민들은 도화동에서 양영학교를 중심으로, 노량진 복흥촌에서 복흥촌 진흥회를 중심으로 주변 원주민과 연대하며 일상을 꾸려 나가고자 했다. 송파리 주민들은 비석에 ‘復興’이라는 글자를 새기며 홍수 후 새로운 삶을 꿈꿨다.
한강 인도교 부근에 살던 200여 호의 동부이촌동 주민들은 강 건너 노량진 본동리로 이주했다. 동부이촌동 주민들은 이곳에 ‘복흥촌(復興村)’이라는 이름의 마을을 조성했는데, 차츰 인구가 늘어나며 노량진의 중심지가 되어 갔다. 복흥촌 사람들은 1927년 상부상조기관으로 용흥청년회(湧興靑年會)를 설립하고 교육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광주군 중대면민들은 을축년 대홍수 때의 피해와 공포를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1926년 비석을 세웠다. 현재 송파근린공원에 있는 기념비뒷면에는 “증수(增水) 48척 유실 273호”라고 적혀 있으며, 왼쪽 면에 중대면에서 1926년 6월 건립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잠실리에서는 홍수에 주민들이 모두 높은 집과 나무 위로 피난했는데, 식량도 챙기지 못한 채 버티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이 소식을 들은 봉은사 주지 나청호(羅晴湖)는 사공에게 ‘한 사람 구원하는 데 10원씩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배 다섯 척을 잠실리로 보내 480명을 구출했다고 한다.
◆ 영향 3) 1930년대 경성도시계획 방향의 전환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은 재경성 일본인 유력자층, 조선인의 여론이 반영된 조선어 언론, 경성부, 총독부 등 제각각 나뉘었다. 을축년 대홍수 이후 한강치수사업을 전제로 한 도시 확장 구상을 지향했고, 1930년대 경성시가지계획의 구체적 실행안에 영향을 미쳤다.
‘용산 중심 도시 확장·개발론’(재경성 일본인 유력자층), ‘동서 확장론’(조선어 언론), ‘동서 확장+용산 중심 절충’(경성부), ‘한강 이남 대확장’(총독부) 등으로 을축년 대홍수 발발 이전에는 경성도시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발현되고 있었다.
1925년 대홍수로 한강 주변 침수 피해를 겪은 후 경성부는 도시 확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나타났고, 이에 반해 총독부는 한강치수사업을 통해 한강 이남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구상했다. 도시 확장의 최종 목적지는 한강의 유력 공업지역인 영등포였다.
총독부의 구상은 경성시가지계획안을 입안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강치수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까지 여러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은 한강치수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영향 4) 한강 개발의 당위성과 재난에 대한 기억 소환
한강의 20세기 최대 재해였던 을축년 대홍수의 기억은 지속적으로 소환됐다.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마다 ‘을축년 대홍수 이래……’라는 수식어가 붙곤 한다. 그렇다면 대홍수 발발 100년이 되는 지금, 을축년 대홍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으로 한강이 경성부의 행정구역으로 들어왔으며, 1963년 강남이 서울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비로소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주요한 하천이 됐다. 한강이 서울의 구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한강의 상습적인 홍수와 침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광복 후 여러 차례의 대규모의 홍수 피해를 겪을 때마다 을축년 대홍수의 참혹한 기억이 소환됐고 한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아졌다. 1960~70년대 한강 주변에는 높은 제방이 건설됐고 공유수면매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제방에는 도로가 놓였다. 1982~86년에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어 한강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됐다.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더이상 1925년 참혹했던 을축년 대홍수를 떠올리지 않는다. 한강은 서울 아파트값의 자존심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값비싼 ‘view’가 ‘한강view’이다. 여름이 되면 한강으로 캠핑을 가고, 가을이면 불꽃축제를 보러 한강 변에 모여든다.
을축년 대홍수의 재난의 기억은 한강을 ‘두려움의 대상’에서 ‘우리 삶의 일부’로 변화시켰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2025년 9월 ‘을축년 대홍수’ 관련 기획전시도 계획하고 있으며, 재난과 재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재난 이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